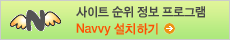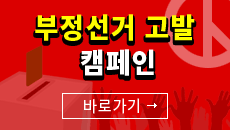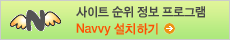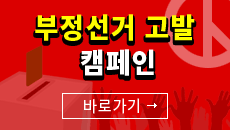| 별을 헤아리다,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보게되다. |
|
|
| 목이 아프도록 고개를 젖히고 밤하늘 별만 쳐다보는데 눈물이 얼굴을 덮는다. |
 |
윤동주의 시(詩)속으로 들어가 나도
별 하나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묻어 두고
별 하나에 고통 받는 북한주민의 모습을 떠올리고
별 하나에 그들을 위한 아린 기도를 담아두며
별 하나에 내 미래의 자화상을 그려 본다.
목이 아프도록 고개를 젖히고 밤하늘 별만 쳐다본다.
눈물이 얼굴을 덮는다.
|
 |
|
잠을 자다 문득 깨어보니 유리문이 밝다. 시골이라 벌써 날이 새는가보다 생각하며 문 을 열고 나오다 아! 아찔하도록 쏟아져 내리는 서쪽 하늘에서 너무도 가까운 달빛에 나는 잠시 어리둥절해져 버린다. 만월(滿月)의 기다림은 잠시 미루어둔 채 미리 그 빛을 쏟아내어 고향을 찾은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 같다. 아직도 쌀쌀한 시골의 밤바람 속에서 그 달을 보며 나는 한참이나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고 보니 뒷산 하늘위서부터 별자리들의 모습도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새벽 2시가 훨씬 지나버린 시간 한기(寒氣)를 느끼며 방에 드러누워 있는데 잠은 좀 체로 오지 않고 이런 저런 상념 속에 젖어 라도 있어야 시간이 흐를 듯싶었다. 오늘밤이 어쩌면 내가 찾는 고향에서의 다시 기약할 수 없는 밤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일까 노환이신 어머니가 이제 오라버니 집으로 가시고 나면 글쎄 언제나 다시 한 번 올수 있을 런지. 왠지 마음이 서글퍼진다. 이미 오래전에 이곳을 떠나 살아 왔었지만 어머니도 안 계시는 곳이 되면 더 이상 기억 속에서만 존재 하는 고향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없을수록 집은 더 사람 사는 모습답게 있어야 된다며 얼마나 오래 내버려 진채 손길이 닿지 않았던 앞마당과 텃밭 주변을 오라버니가 오전 내 말끔히 다듬어 놓은 모습이 보이고 저녁동안 검불들을 모아 태웠던 모닥불 주위에는 내 아이들이 불장난한 흔적들만 남아 있다.
내가 살았던 곳과 근방 마을 들은 타인들이 들어오고 더러 이사를 오고 가고 했지만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만의 부락을 형성했던 예전처럼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 강 씨들이 모여 사는 곳, 윤 씨들이 모여 사는 곳, 하 씨들이 모여 사는 곳...
글장(章)에 밭전(田) 이름 하여 글밭이란 뜻의 이곳은 나의 고향이다. 타 부락 사람들은 장 밭 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 옛날 본관이 의성김씨 중 일부가 이곳에 정착하여 세대를 이루어 살았었고 그분들은 다들 참 열심히도 많이도 공부만 했던 선비들이어서 그렇게 붙여진 마을 이름이라 한다. 그들의 후예중 하나로 태어난 나도 이곳에서 요람기와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러기에 동서남북으로 멀리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산들도 그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강도 나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의 품이다. 그것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멀리서 초저녁부터 울어대던 소쩍새의 소리만이 들릴 뿐 이 정적 속에 혼자 서 있으려니 옛 시조 한 수가 나의 뇌리를 스쳐 간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재[吉再, 1353~1419] 처럼 굳이 나라의 한을 읊조림이 아니어도 좋다. 그렇다. 이곳 산천은 변함이 없으되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자취는 사라졌다. 모두들 떠나 버린 둥지 안에 늙고 병든 어미 새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 있을 뿐이다. 예전 시골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도리였으나 우리 세대에서는 미덕으로나 통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 그나마 남아 있던 몇 안 되는 젊은이들은 짝을 찾지 못해 베트남등지에서 데려온 처자(處子)와 결혼하여 그 명맥(命脈) 이나마 유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시절 아이들의 함성으로 시골 하늘에 울려 퍼졌던 우리의 글밭 초등학교는 더 이상 다닐 학생이 없어 폐교가 되어 버렸고 군(郡)에서 지정한 캠프장의 모습으로 바뀌어 그나마 남아 있을 뿐이다.
21세기 문명의 바람 속에 있다 이 새벽 인적이라곤 하나 없고 지나가는 한 대의 차 소리도 없는 외로이 길을 밝히는 가로등만이 우두커니 서있는 시골길위의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혼자 과거 속으로 돌아와 있는 느낌이다. 요즈음은 북한 인권에 대해 글을 읽고 쓰다 보니 무엇이든 그와 함께 생각하는 것이 버릇이 되 버린 탓일까 그래도 여기는 북한의 시골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 어머니는 옛날에 보리밥을 오랫동안 드셔서 지금까지도 보리밥은 쳐다보는 것도 싫다고 하신다.
지금도 북한의 시골에서는 보리밥은커녕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의 시골은 벌써 그 옛날의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지금은 다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아늑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업(業)을 가지고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함과 남아 있는 이웃들과의 살가운 관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시골은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의 쉼터가 되어 왔지 않았던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4시가 가까웠다. 이미 잠은 깨인지 오래인지라 다시 문을 열고나오니 그사이 달은 서쪽 하늘 아래로 지고 이제 밤하늘은 별들의 시간이다. 그야말로 누가 뿌려 놓은 듯이 밤하늘에 빼곡히 박혀 보석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의 모습은 시골이어서 더 가능한 정경(情景)이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별 그리고 반짝이는 빛의 강도도 조금씩 다르게 보였다. 별자리들은 더욱더 선명하기만 하다. 어린 시절 늘 상 같은 모습이었기에 무심하게 쳐다보았던 밤하늘이 오늘은 참 새롭게만 보인다. 꼬리를 물고 사라지는 별똥별의 모습도 보인다.
흘러가다 잠시 멈추고 또 흘러가기를 반복하는 한개 별의 모습이 보인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 떠돌이별처럼 지금도 고향을 떠난 탈북자들이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 유리하고 있겠지. 그들에게 있어서도 고향이란 소중한 자리일진대 그럼에도 떠나야 하는 얼마나 많은 아픔의 장소이기도 할까? 이 시간에도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방황하고 있을까?
그에 비하면 고향 하늘아래서 한가로이 별을 헤고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일상으로부터 얻은 이 휴가(?)를 얼마나 유유자적(悠悠自適)하게 보내고 있는가? 물론 어머니의 병중(病中)이라는 근심도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감사라는 것은 현재 자신이 처한 입장보다 극한(極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생각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인생의 길 모퉁이에서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볼때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재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윤동주의 시(詩)속으로 들어가 나도
별 하나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묻어 두고
별 하나에 고통 받는 북한주민의 모습을 떠올리고
별 하나에 그들을 위한 아린 기도를 담아두며
별 하나에 내 미래의 자화상을 그려 본다.
목이 아프도록 고개를 젖히고 밤하늘 별만 쳐다본다.
눈물이 얼굴을 덮는다.
|
|
 등록일 : 2007-05-02 (08:32) 등록일 : 2007-05-02 (08:32) |
|
|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기 원하세요?
아래 배너를 눌러 네비 툴바를 설치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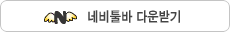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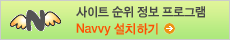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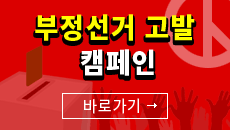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