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후대들에게 조국의 푸른 숲을 안겨주시려”라는 제하의 글에서 김정일을 마치 애국의 헌신자라 강조했다.
그 기사를 보니 문득 북한에 있을 때 나무심기와 관련해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이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으로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듣고 보면 북한의 김정일이 아주 대단한 애국자이고 북한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속깊은 사람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것은 현실이 아닌 완전한 거짓말이다. 북한의 철면피하게도 김정일만이 발휘 할 수 있는 기만행위이다.
철면피하기는 노동신문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김정일이 자강도의 어느 한 양묘장을 돌아보면서 북한의 모든 식물원들과 양묘장들의 역할을 높여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도시의 원림화, 모든 산을 녹화 화하여 나라를 수림이 우거지고 백과가 무르익는 무릉도원으로 만들데 대하여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했다는 이 말의 내용은 20년 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오늘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한가? 나라의 모든 산은 벌거숭이(민둥산)으로 더 벗겨져 나가고 있다. 사람조차 살기 어려워 고향을 떠나 이국에서 멸시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 못하게 만든, 지옥 같은 세상이 바로 김정일이 영도하는 북한사회이다.
남한에 식목일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식수절”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
북한에서는 50년 전 김일성이 김정일과 같이 평양시에 있는 문수봉에 올라 나무를 심은 날을 식수절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는 북한의 모든 산들은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듯이 산림자원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땔감이 없으면 해 먹을 수도 없는 열악한 북한 사람들의 실정에서 산에 나무를 그냥 둬 둘리가 만무하다.
당장 끼니를 에울 식량이 없어 산의 나무를 찍어내어 장에 내다 팔아야 하루 한 끼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또 산에 있는 나무를 찍어다가 직접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과 밀거래를 하여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주민들은 김정일이 산에 나무를 심으라고 강요하면 속으로 코웃음을 친다. 대체로 북한에서나무를 심기 노역에는 어린학생들을 내모는데, 그것이 바로 “소년단림”이요 “사로청림이요”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책임 구역을 정해 놓았지만 그곳에 나무 묘목을 수십 년 동안 심고, 심어도 대부분 죽어버리고 제대로 자라는 나무는 별로 없다. 북한의 학생들이 나무심기의 요령을 몰라서 가아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땔감이 없어 묘목을 뿌리째로 뽑아가고, 먹을 식량이 없어 그 곳에 뙈기밭을 일으킨다.
혹시 북한에 수려한 산림이 있다면, 보안성이 지키고 있는 김일성의 사적지나 김정일의 별장 주변밖에 없다.
얼마 전 남한의 시민단체들에서도 북한의 민둥산을 걱정하며 수많은 묘목을 키워 보내줬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묘목들이 북한의 산들에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도 어렵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생존권탄압에 지칠 대로 지친 인간생지옥에서 나무가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저 하늘의 무지개를 잡으려는 아이들의 꿈”과 같이 허망하다.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산책을 위해 묘목 장을 들러본 것을 가지고, 허황된 거짓 말만하지 말고 그 묘목 장을 들러볼 때 “김정일, 당신은 북한의 산을 이렇게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고 체면이 있는가?”라는 제하의 글로 김정일의 개인이기주의 사상에 칼날을 들이 박아야 한다.
북한에 김정일이 없어야 인민이 살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 아닌가? 노동신문은 김정일에게 맹목적으로 아부 하지 말고 남한과 같이 민주주의 언론들을 본받아 할 말은 하면서 사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을 자각해야 한다.
탈북자 이경희 (2006년 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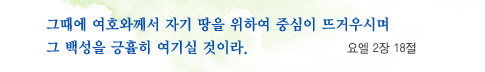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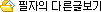







 등록일 : 2007-09-20 (08:53)
등록일 : 2007-09-20 (08:53)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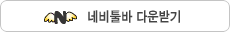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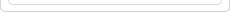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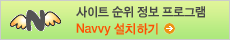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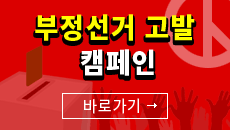


 잠언31장25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언31장25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언31장24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잠언31장24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요한복음15장16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요한복음15장16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