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쓸쓸한 보슬비가 내렸다 무겁게 잠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호미를 들고 집밖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비닐 주머니에 어제저녁 몰래 숨겨두었던 옥수수떡 몇 개와 소주를 넣어 주시면서 몸이 많이 불편한 아들이 일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올해는 영예군인들도 공급이 끊기여 군에서 땅을 몇평씩 나누어주면서 알곡을 심어먹으라 했다. 군대에서 훈련하며 다친 허리와 다리는 심한 영양 부족으로 움직일수 없이 더 악화 되었지만 그냥 누워있다간 온가족이 굶어 죽을 형편이어서 지팽이에 몸을 의지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말이 밭이지 나무뿌리와 풀뿌리가 그대로 박혀 있는 야산이다. 얼마나 일을 했는지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무릎은 거친 땅에 할퀴어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흘렀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속바지에서도 물이 줄줄 떨어졌다. 아침에 어머니가 싸주시던 굳어진 옥수수떡이 생각나 큰 소나무 밑에 들어가서 점심밥을 풀었다. 딱딱한 옥수수떡이 목에 넘어가다 걸리고 부셔지면서 도로 기어 나오려고 알알히 흩어졌다. 그나마 술 한잔이 없었다면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온몸이 성 한데가 없다.
그럭저럭 서산에 해가 넘어 가자 나는 지친다리를 끌며 집으로 향했다. 심술궃은 하늘이 더 강한 빗줄기를 뿌리며 절룩대는 내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지친 몸이 물먹은 솜처럼 땅에 스며든다. 맥없이 겨우 한발 한발 걸어가는데 마침 역전이 보였다. (저기 들려 좀 쉬었다가야지...) 나는 엎어진 김에 쉬여 가리라하고 역 안으로 들어갔다. 누렇게 병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빈틈없이 앉아 귀찮은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한참 두리번거려서야 작은 공간을 발견하고 그리로 가 비집고 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야! 증명서 보자!”라고 거칠게 소리치며 구두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있어 눈을 떴다. 비 맞고 힘든 몸이 그나마 사람들의 온기에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이다.
깜짝 놀란 나는 잠결에 “예? 증명서? 난 이 고장 사람이고 영예군인인데요 ...”하고 말하자 ”이자식 꽃제비 같은게 ...거짓말은...임마 그러면 영예군인증을 보자.”
“영예군인증이야 집에 있지...”
“이 자식이 어데라고 대답질이야! ...야!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라”
안전원이 고함을 지르자 건장한 제대군인들이 네 다섯명이 달라붙어 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역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나오는 9.27상무라 했다. 치고 때리고 벽에 박고 얼마나 맞았는지 나의 얼굴은 피로 붉게 물들여져 있었고 몸은 감각이 없는 죽은 송장처럼 늘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지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보안원이 때리라고 지시를 내려 구타하는데 감히 누가 말리랴. 사정없이 주먹과 구두발이 내 몸과 얼굴에 떨어질 때마다 눈에서 퍼런 불이 번쩍번쩍 일었다. 그리고 눈 코 입 귀 구멍이라고 생긴데는 다 피가 쏟아져 나왔다. 정신이 점점 흐려졌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먼저 늙으신 어머니가 떠올랐고 처자식이 떠올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들이 마구 퍼 부어대는 찬물이 입으로 흘러들자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사방을 들러 보는 순간 눈에서 불이 일었다. 내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개처럼 질질 끌고와 사무실에 처박아 넣었던 것이다. (도데체 내가 무었을 잘못했는데... )나는 벽에 몸을 기대고 일어나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러자 처음에 도발을 걸던 키 작은 사나이가 다가와서 지껄였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역 보안원 중위 김장식이란 말이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 바른대로 말해”
“난 죄인이 아니니 점잖게 말해라”고 말하자 김장식은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군.”라고 씨벌였다. 그러자 9.27상무라는 자들이 또 달라붙어 때리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쓰러졌다.
졸고 있던 별들이 푸름푸름 밝아오는 아침 해에 밀려 자취를 감추자 새벽이슬이 부드럽게 피 묻은 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저승의 문턱을 오르내리던 내가 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모가 물려준 건장한 육체는 어데 가고 없고 보기흉한 병신이 된 몸만이 개처럼 앙상하게 길가에 누워있다. 이젠 눈물마저 말라 멍하고 뻑뻑한 눈동자만 슴뻑인다.
일어나 집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몸이 천근만근 돌덩이 같아 움직일 수 없다. 하는 수 없이 하늘에 목숨을 맡기고 있는데 고맙게도 길 가던 분이 친절히 집을 물어보시더니 피투성이인 나를 들쳐 업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과 마음이 아프게 저려온다. 그리고 당장 달려가 총으로 그 북한 쓰레기들을 죽이고 싶다...이 세상에서 인권유린이 가장 심한 나라, 백성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나라, 인간의 자존심을 기어가는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독재의 땅, 김정일 정권이 망할 날이 과연 언제 올까? 생각 할수록 그곳에 남아있는 나와 같은 영예군인들이 불쌍해 나 혼자만 남한으로와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죄스럽다.
... ... ...
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경상북도 마산의 자그마한 바다가 마을로 강의를 나간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노란금띠를 두른 붉은 모자를 쓴 한 나이드신 분이 유독 눈에 띄었다. 한시간동안 진행된 강의가 끝나자 그분이 천천히 내게로 오시며 악수를 청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짤막한 인사말속에 많은 말이 담겨져 있었다. 자신은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이라면서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아 많은 배려와 우대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당신도 남한에서 군복무 하며 몸을 다쳤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참 들을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것이 하늘이 준 복이 아닐까??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탈북자 이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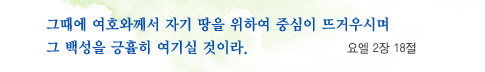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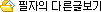





 등록일 : 2009-06-18 (11:18)
등록일 : 2009-06-18 (11:18)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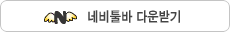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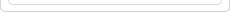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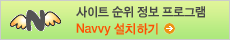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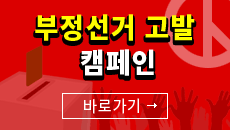


 잠언31장25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언31장25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언31장24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잠언31장24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요한복음15장16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요한복음15장16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